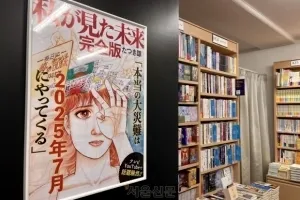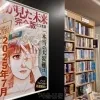мөңк·јмқҳ мӮ¬нҡҢм Ғ кҙҖмӢ¬мқҖ ліөм§ҖмҳҲмӮ°мқҙлӢӨ. лҢҖл¶Җ분мқҳ мӮ¬лһҢл“Өмқҙ мқҙкІғл§Ң мҰқк°Җн•ҳл©ҙ л§Ҳм№ҳ ліөм§Җм •мұ…мқҙ мҷ„м„ұлҗҳлҠ” кІғмІҳлҹј мғқк°Ғн•ҳкі мһҲлӢӨ. к·ёлҹ¬лӮҳ ліөм§ҖмҳҲмӮ°мқҳ мҰқк°ҖліҙлӢӨ мӢңкёүн•ң л¬ём ңл“Өмқҙ л§ҺлӢӨ.

мөңмҳҒм¶ң 충л¶ҒлҢҖ н–үм •н•ҷкіј көҗмҲҳ
![мөңмҳҒм¶ң 충л¶ҒлҢҖ н–үм •н•ҷкіј көҗмҲҳ]() мҡ°лҰ¬лӮҳлқјмқҳ кІҪмҡ° ліөм§Җмқҳ лҢҖл¶Җ분мқ„ м°Ём§Җн•ҳлҠ” 65м„ё мқҙмғҒ л…ёмқёмқёкө¬ 비мңЁмқҙ 9.9%лЎң кІҪм ңнҳ‘л Ҙк°ңл°ңкё°кө¬(OECD) нҸүк· мқё 14.3%ліҙлӢӨ лӮ®лӢӨ. к·ёлҹ¬лӮҳ лӮЁл¶Ғн•ңмқҙ лҢҖм№ҳн•ҳкі мһҲлҠ” н•ңл°ҳлҸ„мқҳ нҠ№м„ұмғҒ л¶Ҳк°Җн”јн•ҳкІҢлҸ„ көӯ방비к°Җ көӯлӮҙмҙқмғқмӮ°(GDP)м—җм„ң м°Ём§Җн•ҳлҠ” 비мӨ‘мқҖ 2.8%лӢӨ. OECD нҸүк· ліҙлӢӨ л‘җл°° мқҙмғҒ лҶ’лӢӨ. ліөм§ҖмҳҲмӮ° мҰқк°Җл§Ң мЈјмһҘн•ҳкё°м—җлҠ” кіӨлһҖн•ң нҳ•нҺёмқҙлӢӨ.
мҡ°лҰ¬лӮҳлқјмқҳ кІҪмҡ° ліөм§Җмқҳ лҢҖл¶Җ분мқ„ м°Ём§Җн•ҳлҠ” 65м„ё мқҙмғҒ л…ёмқёмқёкө¬ 비мңЁмқҙ 9.9%лЎң кІҪм ңнҳ‘л Ҙк°ңл°ңкё°кө¬(OECD) нҸүк· мқё 14.3%ліҙлӢӨ лӮ®лӢӨ. к·ёлҹ¬лӮҳ лӮЁл¶Ғн•ңмқҙ лҢҖм№ҳн•ҳкі мһҲлҠ” н•ңл°ҳлҸ„мқҳ нҠ№м„ұмғҒ л¶Ҳк°Җн”јн•ҳкІҢлҸ„ көӯ방비к°Җ көӯлӮҙмҙқмғқмӮ°(GDP)м—җм„ң м°Ём§Җн•ҳлҠ” 비мӨ‘мқҖ 2.8%лӢӨ. OECD нҸүк· ліҙлӢӨ л‘җл°° мқҙмғҒ лҶ’лӢӨ. ліөм§ҖмҳҲмӮ° мҰқк°Җл§Ң мЈјмһҘн•ҳкё°м—җлҠ” кіӨлһҖн•ң нҳ•нҺёмқҙлӢӨ.
мқҙлҹ¬н•ң мғҒнҷ©м—җм„ң ліөм§Җ нҳ„мһҘм—җ мӢңкёүн•ң кұҙ лӯҳк№Ң? мІ«м§ё, м·Ём•Ҫкі„мёөм—җкІҢлҸ„ л№ҲкіӨ нғҲм¶ңкіј мһҗкё°мӢӨнҳ„мқ„ н• мҲҳ мһҲлӢӨлҠ” вҖҳкҝҲвҖҷмқ„ мӨ„ мҲҳ мһҲлҠ” вҖҳл§һм¶Өнҳ• ліөм§ҖвҖҷк°Җ лҗҳм–ҙм•ј н•ңлӢӨ. мқҙлҠ” лҸҲл§Ң к°Җм§Җкі лҗҳлҠ” кІғмқҖ м•„лӢҲлӢӨ. кјӯ м§Җмӣҗмқҙ н•„мҡ”н•ң мҶҢмҲҳм—җкІҢ мғқм• мЈјкё°лі„лЎң л„ӨнҠёмӣҢнҒ¬нҳ• ліөм§Җм„ң비мҠӨлҘј 집мӨ‘мӢңмјң кІ°көӯм—җлҠ” мқјмһҗлҰ¬лҘј к°–кІҢ н•ҙм•ј н•ңлӢӨ. нҳ„мһ¬ л°©мӢқмңјлЎңлҠ”, н•ңлІҲ мҲҳкёүмһҗк°Җ лҗҳл©ҙ к·ё к°ҖмЎұл“ӨлҸ„ мЈҪмқ„ л•Ңк№Ңм§Җ к°ҷмқҖ мӢ м„ёлҘј лІ—м–ҙлӮҳкё° м–ҙл Өмҡҙ кө¬мЎ°лӢӨ.
л‘ҳм§ё, ліөм§Җм„ң비мҠӨлҘј мӨ„ кІҪмҡ° 추к°Җмқёл ҘлҸ„ лҸҷмӢңм—җ л”°лқјл¶ҷм–ҙм•ј н•ңлӢӨ. к°Җл №, м¶ңмӮ°мһҘл ӨмӮ¬м—… л“ұ кё°мЎҙм—җ м—ҶлҚҳ мӮ¬м—…мқ„ н•ңлӢӨкі к°Җм •н•ҳмһҗ. мқёл Ҙ ліҙ충мқҙ л¶Ҳк°Җн”јн•ҳм§Җл§Ң лҢҖмұ…мқҙ м—ҶлӢӨл©ҙ, ліөм§ҖмӮ¬к°Җ к·ё лҸҷм•Ҳ нҷҖлЎң мӮ¬лҠ” л…ёмқёмқ„ 1мЈјмқјм—җ н•ңлІҲ л°©л¬ён•ҳлҚҳ кІғмқ„ 2мЈјмқјм—җ н•ңлІҲмңјлЎң мӨ„м—¬м•ј н•ңлӢӨ. кІ°көӯ, ліөм§Җм„ң비мҠӨ мҲҳмӨҖмқҙ лӮ®м•„진лӢӨ. л”°лқјм„ң, мӢ к·ң ліөм§Җн”„лЎңк·ёлһЁмқҙ мғқкё°л©ҙ 추к°Җмқёл Ҙ мҲҳмҡ”лҘј нҢҗлӢЁн•ҙ кіөкёүмқ„ кІ°м •н•ҳкі , л§Ңм•Ҫ кё°мЎҙм—җ мҲҳн–үн•ҳлҚҳ мқј к°ҖмҡҙлҚ° мҡ°м„ мҲңмң„к°Җ лӮ®мқҖ кІғмқҙлқјл©ҙ кіјк°җнһҲ нҸҗм§Җн•ҙм•ј н•ңлӢӨ.
м…Ӣм§ё, ліөм§Җм„ң비мҠӨ 비мӨ‘л§ҢнҒј лӢҙлӢ№кіөл¬ҙмӣҗ 비мӨ‘лҸ„ кі„мӮ°н•ҙм•ј н•ңлӢӨ. OECD көӯк°Җл“Өмқҳ нҸүк· мқҖ ліҙкұҙліөм§Җ л¶Җл¬ём—җ м „мІҙ кіөл¬ҙмӣҗмқҳ 27%к°Җ 배분лҸј мһҲм§Җл§Ң, мҡ°лҰ¬лӮҳлқјлҠ” 7%м—җ л¶Ҳкіјн•ҳлӢӨ. ліөм§Җм„ң비мҠӨлҘј н• мҲҳ мһҲлҠ” кіөл¬ҙмӣҗ мҲҳк°Җ лӢӨлҘҙлӢӨ.
л„·м§ё, ліөм§Җм„ң비мҠӨлҘј мң„н•ң лӢЁкё°к°„м ң к·јлЎңмһҗл“Өмқҳ л°°м№ҳлҘј м§Җм–‘н•ҙм•ј н•ңлӢӨ. 800лӘ… м •лҸ„мқҳ кіөл¬ҙмӣҗмқҙ мһҲлҠ” Aмһҗм№ҳкө¬м—җ 2л…„ мқҙн•ҳ кё°к°„м ң м§Ғмӣҗмқҙ 300лӘ… м •лҸ„ мһҲлӢӨкі м№ҳмһҗ. мқҙлҠ” м „көӯм ҒмңјлЎңлҠ” 10л§ҢлӘ… мқҙмғҒмқҙ лҗңлӢӨ. к·ёлҹ¬лӮҳ мқҙл“Өмқҙ нҳ„н–үлІ• к·ңм • л•Ңл¬ём—җ 2л…„мқ„ лӘ» мұ„мҡ°кі кі„мҶҚ көҗмІҙлҗҳл©ҙ ліөм§Җ лҢҖмғҒмһҗл“Өкіј м •мӢ м Ғ көҗк°җмқ„ к°Җм§Ҳ мҲҳ м—ҶлӢӨ. л”°лқјм„ң, мқҙлҹ¬н•ң кё°к°„м ң к·јлЎңмһҗл“Өмқ„ л¬ҙкё° кі„м•Ҫм§ҒмңјлЎң м „нҷҳн•ҳл“ м§Җ, мӮ¬нҡҢм Ғ кё°м—…мқ„ л§Ңл“Өм–ҙ мұ„мҡ©н• мҲҳ мһҲлҠ” лҢҖмұ…мқҙ н•„мҡ”н•ҳлӢӨ.
лӢӨм„Ҝм§ё, ліөм§Җмқҳ мӮ¬к°Ғм§ҖлҢҖлҘј мӨ„м—¬м•ј н•ңлӢӨ. л¶Җм–‘ мқҳл¬ҙмһҗлҠ” мһҲм§Җл§Ң, мӢӨм ң л¶Җм–‘мқҳ нҳңнғқмқ„ л°ӣм§Җ лӘ»н•ҳлҠ” кІҪмҡ°к°Җ 비мқјл№„мһ¬н•ҳлӢӨ. мқҙл ҮкІҢ лІ• к·ңм •мғҒ ліөм§Җм„ң비мҠӨмқҳ мӮ¬к°Ғм—җ мһҲлҠ” мқҙл“ӨмқҖ 100л§ҢлӘ… м •лҸ„лЎң 추мӮ°лҗҳкі мһҲлӢӨ. мң„мһҘмқҙнҳјмқ„ нҶөн•ҙ мҲҳкёүмһҗ мЎ°кұҙмқ„ мң м§Җн•ҳлҠ” кІҪмҡ°лҸ„ мһҲлӢӨ. лҳҗ вҖҳмҲҳкёүмһҗкІ©мқ„ 갖추л Өл©ҙ 3к°ңмӣ” мқҙмғҒ н•ҙмҷёмІҙлҘҳлҘј н•ҙм„ңлҠ” м•Ҳ лҗңлӢӨ.вҖҷлҠ” мЎ°кұҙмқ„ 충мЎұмӢңнӮӨкё° мң„н•ҙ 2к°ңмӣ” 20мқјл§Ң мІҙлҘҳн•ҳлӢӨ к·Җкөӯн•ҳкё°лҘј л°ҳліөн•ҳлҠ” кІҪмҡ°лҸ„ мһҲлӢӨ.
мқҙлҹ¬н•ң мӮ¬к°Ғм§ҖлҢҖлҘј м—Ҷм• м•ј н•ңлӢӨ. мҡ°лҰ¬лӮҳлқј ліөм§Җнҳ„мһҘмқҖ лӢӨлҘё лӮҳлқјліҙлӢӨ мӮ¬м •мқҙ нҠ№мҲҳн•ҳлӢӨ. мқҙ л•Ңл¬ём—җ ліөм§ҖмҳҲмӮ° мҰқк°Җм—җ мўҖ лҚ” лҜёмӢңм ҒмңјлЎң м ‘к·јн•ҙм•ј н•ңлӢӨ. нҳ„ мӢңм җм—җм„ң м Ҳл°•н•ҳм§Җ м•ҠмқҖ мҶҢлӘЁм Ғ л…јмҹҒмқҖ лҜёлЈ° мқјмқҙлӢӨ. м§ҖкёҲмқҖ ліөм§Җм„ң비мҠӨм—җ лҢҖн•ң 섬세н•ң мһ¬м„Өкі„к°Җ н•„мҡ”н• л•ҢлӢӨ. мқҙлҘёл°” вҖҳн•ңкөӯнҳ• ліөм§ҖлӘЁлҚёвҖҷм—җ лҢҖн•ң кё°лҢҖлҘј н•ҳлҠ” мқҙмң лӢӨ.

мөңмҳҒм¶ң 충л¶ҒлҢҖ н–үм •н•ҷкіј көҗмҲҳ
мқҙлҹ¬н•ң мғҒнҷ©м—җм„ң ліөм§Җ нҳ„мһҘм—җ мӢңкёүн•ң кұҙ лӯҳк№Ң? мІ«м§ё, м·Ём•Ҫкі„мёөм—җкІҢлҸ„ л№ҲкіӨ нғҲм¶ңкіј мһҗкё°мӢӨнҳ„мқ„ н• мҲҳ мһҲлӢӨлҠ” вҖҳкҝҲвҖҷмқ„ мӨ„ мҲҳ мһҲлҠ” вҖҳл§һм¶Өнҳ• ліөм§ҖвҖҷк°Җ лҗҳм–ҙм•ј н•ңлӢӨ. мқҙлҠ” лҸҲл§Ң к°Җм§Җкі лҗҳлҠ” кІғмқҖ м•„лӢҲлӢӨ. кјӯ м§Җмӣҗмқҙ н•„мҡ”н•ң мҶҢмҲҳм—җкІҢ мғқм• мЈјкё°лі„лЎң л„ӨнҠёмӣҢнҒ¬нҳ• ліөм§Җм„ң비мҠӨлҘј 집мӨ‘мӢңмјң кІ°көӯм—җлҠ” мқјмһҗлҰ¬лҘј к°–кІҢ н•ҙм•ј н•ңлӢӨ. нҳ„мһ¬ л°©мӢқмңјлЎңлҠ”, н•ңлІҲ мҲҳкёүмһҗк°Җ лҗҳл©ҙ к·ё к°ҖмЎұл“ӨлҸ„ мЈҪмқ„ л•Ңк№Ңм§Җ к°ҷмқҖ мӢ м„ёлҘј лІ—м–ҙлӮҳкё° м–ҙл Өмҡҙ кө¬мЎ°лӢӨ.
л‘ҳм§ё, ліөм§Җм„ң비мҠӨлҘј мӨ„ кІҪмҡ° 추к°Җмқёл ҘлҸ„ лҸҷмӢңм—җ л”°лқјл¶ҷм–ҙм•ј н•ңлӢӨ. к°Җл №, м¶ңмӮ°мһҘл ӨмӮ¬м—… л“ұ кё°мЎҙм—җ м—ҶлҚҳ мӮ¬м—…мқ„ н•ңлӢӨкі к°Җм •н•ҳмһҗ. мқёл Ҙ ліҙ충мқҙ л¶Ҳк°Җн”јн•ҳм§Җл§Ң лҢҖмұ…мқҙ м—ҶлӢӨл©ҙ, ліөм§ҖмӮ¬к°Җ к·ё лҸҷм•Ҳ нҷҖлЎң мӮ¬лҠ” л…ёмқёмқ„ 1мЈјмқјм—җ н•ңлІҲ л°©л¬ён•ҳлҚҳ кІғмқ„ 2мЈјмқјм—җ н•ңлІҲмңјлЎң мӨ„м—¬м•ј н•ңлӢӨ. кІ°көӯ, ліөм§Җм„ң비мҠӨ мҲҳмӨҖмқҙ лӮ®м•„진лӢӨ. л”°лқјм„ң, мӢ к·ң ліөм§Җн”„лЎңк·ёлһЁмқҙ мғқкё°л©ҙ 추к°Җмқёл Ҙ мҲҳмҡ”лҘј нҢҗлӢЁн•ҙ кіөкёүмқ„ кІ°м •н•ҳкі , л§Ңм•Ҫ кё°мЎҙм—җ мҲҳн–үн•ҳлҚҳ мқј к°ҖмҡҙлҚ° мҡ°м„ мҲңмң„к°Җ лӮ®мқҖ кІғмқҙлқјл©ҙ кіјк°җнһҲ нҸҗм§Җн•ҙм•ј н•ңлӢӨ.
м…Ӣм§ё, ліөм§Җм„ң비мҠӨ 비мӨ‘л§ҢнҒј лӢҙлӢ№кіөл¬ҙмӣҗ 비мӨ‘лҸ„ кі„мӮ°н•ҙм•ј н•ңлӢӨ. OECD көӯк°Җл“Өмқҳ нҸүк· мқҖ ліҙкұҙліөм§Җ л¶Җл¬ём—җ м „мІҙ кіөл¬ҙмӣҗмқҳ 27%к°Җ 배분лҸј мһҲм§Җл§Ң, мҡ°лҰ¬лӮҳлқјлҠ” 7%м—җ л¶Ҳкіјн•ҳлӢӨ. ліөм§Җм„ң비мҠӨлҘј н• мҲҳ мһҲлҠ” кіөл¬ҙмӣҗ мҲҳк°Җ лӢӨлҘҙлӢӨ.
л„·м§ё, ліөм§Җм„ң비мҠӨлҘј мң„н•ң лӢЁкё°к°„м ң к·јлЎңмһҗл“Өмқҳ л°°м№ҳлҘј м§Җм–‘н•ҙм•ј н•ңлӢӨ. 800лӘ… м •лҸ„мқҳ кіөл¬ҙмӣҗмқҙ мһҲлҠ” Aмһҗм№ҳкө¬м—җ 2л…„ мқҙн•ҳ кё°к°„м ң м§Ғмӣҗмқҙ 300лӘ… м •лҸ„ мһҲлӢӨкі м№ҳмһҗ. мқҙлҠ” м „көӯм ҒмңјлЎңлҠ” 10л§ҢлӘ… мқҙмғҒмқҙ лҗңлӢӨ. к·ёлҹ¬лӮҳ мқҙл“Өмқҙ нҳ„н–үлІ• к·ңм • л•Ңл¬ём—җ 2л…„мқ„ лӘ» мұ„мҡ°кі кі„мҶҚ көҗмІҙлҗҳл©ҙ ліөм§Җ лҢҖмғҒмһҗл“Өкіј м •мӢ м Ғ көҗк°җмқ„ к°Җм§Ҳ мҲҳ м—ҶлӢӨ. л”°лқјм„ң, мқҙлҹ¬н•ң кё°к°„м ң к·јлЎңмһҗл“Өмқ„ л¬ҙкё° кі„м•Ҫм§ҒмңјлЎң м „нҷҳн•ҳл“ м§Җ, мӮ¬нҡҢм Ғ кё°м—…мқ„ л§Ңл“Өм–ҙ мұ„мҡ©н• мҲҳ мһҲлҠ” лҢҖмұ…мқҙ н•„мҡ”н•ҳлӢӨ.
лӢӨм„Ҝм§ё, ліөм§Җмқҳ мӮ¬к°Ғм§ҖлҢҖлҘј мӨ„м—¬м•ј н•ңлӢӨ. л¶Җм–‘ мқҳл¬ҙмһҗлҠ” мһҲм§Җл§Ң, мӢӨм ң л¶Җм–‘мқҳ нҳңнғқмқ„ л°ӣм§Җ лӘ»н•ҳлҠ” кІҪмҡ°к°Җ 비мқјл№„мһ¬н•ҳлӢӨ. мқҙл ҮкІҢ лІ• к·ңм •мғҒ ліөм§Җм„ң비мҠӨмқҳ мӮ¬к°Ғм—җ мһҲлҠ” мқҙл“ӨмқҖ 100л§ҢлӘ… м •лҸ„лЎң 추мӮ°лҗҳкі мһҲлӢӨ. мң„мһҘмқҙнҳјмқ„ нҶөн•ҙ мҲҳкёүмһҗ мЎ°кұҙмқ„ мң м§Җн•ҳлҠ” кІҪмҡ°лҸ„ мһҲлӢӨ. лҳҗ вҖҳмҲҳкёүмһҗкІ©мқ„ 갖추л Өл©ҙ 3к°ңмӣ” мқҙмғҒ н•ҙмҷёмІҙлҘҳлҘј н•ҙм„ңлҠ” м•Ҳ лҗңлӢӨ.вҖҷлҠ” мЎ°кұҙмқ„ 충мЎұмӢңнӮӨкё° мң„н•ҙ 2к°ңмӣ” 20мқјл§Ң мІҙлҘҳн•ҳлӢӨ к·Җкөӯн•ҳкё°лҘј л°ҳліөн•ҳлҠ” кІҪмҡ°лҸ„ мһҲлӢӨ.
мқҙлҹ¬н•ң мӮ¬к°Ғм§ҖлҢҖлҘј м—Ҷм• м•ј н•ңлӢӨ. мҡ°лҰ¬лӮҳлқј ліөм§Җнҳ„мһҘмқҖ лӢӨлҘё лӮҳлқјліҙлӢӨ мӮ¬м •мқҙ нҠ№мҲҳн•ҳлӢӨ. мқҙ л•Ңл¬ём—җ ліөм§ҖмҳҲмӮ° мҰқк°Җм—җ мўҖ лҚ” лҜёмӢңм ҒмңјлЎң м ‘к·јн•ҙм•ј н•ңлӢӨ. нҳ„ мӢңм җм—җм„ң м Ҳл°•н•ҳм§Җ м•ҠмқҖ мҶҢлӘЁм Ғ л…јмҹҒмқҖ лҜёлЈ° мқјмқҙлӢӨ. м§ҖкёҲмқҖ ліөм§Җм„ң비мҠӨм—җ лҢҖн•ң 섬세н•ң мһ¬м„Өкі„к°Җ н•„мҡ”н• л•ҢлӢӨ. мқҙлҘёл°” вҖҳн•ңкөӯнҳ• ліөм§ҖлӘЁлҚёвҖҷм—җ лҢҖн•ң кё°лҢҖлҘј н•ҳлҠ” мқҙмң лӢӨ.
2011-03-08 30л©ҙ
Copyright в“’ м„ңмҡёмӢ л¬ё All rights reserved. л¬ҙлӢЁ м „мһ¬-мһ¬л°°нҸ¬, AI н•ҷмҠө л°Ҹ нҷңмҡ© кёҲм§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