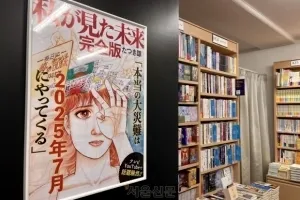이민영 사회부 기자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는 실종 12일째인 18일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다. 기체 결함, 조종사 실수, 납치 등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먼저 대두한 것은 테러였다. 탑승객 중 2명이 도난 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도난 여권은 테러와 관련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언론을 포함한 전 세계 유수 언론은 각각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테러를 의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면 뉴스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 테러로 채워질 때가 잦다.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등 중동에서 발생하는 폭탄 테러는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테러 위험은 빠지지 않는 단골 기사다. 소치올림픽을 앞두고는 체첸 반군이 테러를 시도하겠다고 위협했다. 다행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6월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도 안전하리란 보장은 없다. 반(反) 월드컵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 ‘블랙블록’이 월드컵 기간 국가대표팀이 이용하는 호텔 등을 공격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1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 쿤밍 철도역 테러 사건 이후 중국 주요 도시는 보안이 부쩍 강화됐다고 한다.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 17일 강남구청역에서는 폭발물 오인 소동이 벌어졌다. 폭발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발물이 맞다고 언론에 잘못 말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전 세계 어디든 테러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저서를 통해 현대 사회를 ‘피로사회’, ‘투명사회’로 규정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국제부 기자가 보는 현대 사회는 ‘테러사회’다. 21세기 세계 시민에게 테러는 안고 가야 할 숙제다. 종교, 정치, 인종 등 갈등이 있는 곳에 테러는 항상 따라다닌다.
당장 해결할 방법을 찾긴 어렵겠지만 확실한 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몇 마디 발언으로는 테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들이 내놓는 ‘강력 규탄’ 따위 말보다는 현장의 비극적인 사진 한 장을 신문에 싣고 싶은 이유다.
min@seoul.co.kr
2014-03-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