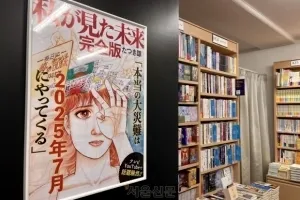박현갑 편집국 부국장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대한 교육계 일각의 부정적 평가의 편린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는 부총리 부서로 이명박 정부 때보다 위상이 격상됐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황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대표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이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물론 국민들도 장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하자 정치적 무게감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해 현안 해결은 물론 교육개혁의 방향과 비전까지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이나 장관의 행보를 보면 아쉬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게 대입수능 개선안을 둘러싼 혼선이다. 얼마 전 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입수능 개선안을 3일에 걸쳐 두 번이나 발표했다. 처음에는 “변별력을 높여 만점자를 줄이겠다”고 했다. 언론은 이를 “내년 입시 올해보다 어렵게 나온다”고 풀어서 보도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3일 뒤, “올해처럼 내년에도 쉽게 출제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은 이를 “도로 ‘물수능’”으로 꼬집었다.
대학 입시에 쏠린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한다면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는 유독 ‘뜨거운 감자’다. 난이도 조정이 잘못되면 ‘물수능’, ‘불수능’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수능시험 당일에는 직장인 출근 시간은 물론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조정될 정도다. 특히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의 경우, 자녀의 입시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대입 관련 대책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교육부가 해명자료 배포에 급급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황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료들은 이처럼 민감한 여론의 흐름을 몰랐을까? 두 번째 발표가 청와대의 질타 끝에 나온 긴급 발표임을 감안하면 정책 홍보의 실패였다.
장관 본인의 대학 구조조정 관련 발언도 마찬가지다. 황 장관은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신창역으로 가는 누리로 열차 4호차 강의실에서 순천향대 신입생과 학부모 12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생과 함께하는 교육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학령인구 감축과 관련한 질 제고에 관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다. “대학의 정원을 교육부가 늘리라거나 줄이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대학 구조조정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전직 총장은 이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장관의 소신으로 보이나 교육부 공무원들로서는 곤혹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기대하기 힘들어 황 장관 취임 전인 지난해 초 대학 구조개혁 추진안을 발표한 상태다. 2023년까지 대입 정원을 현재보다 16만명 줄이려고 5개 등급으로 대학 평가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황 장관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자율 아닌 통제책을 구사했던 터라 장관의 자율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학 구조개혁이나 대입수능처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책은 장관에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를 내야 신뢰를 줄 수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며칠 만에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거나, 실무진이 장관 발언의 취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면 그러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학습열기는 대학 입시를 정점으로 이후 갈수록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시적 교육정책을 세우려면 교육 수장부터 달라져야 한다.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2018학년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고교 문·이과 통합 교육안이나 내년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 중·단기 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2015-03-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